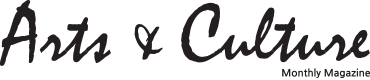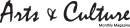내 안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아츠앤컬쳐] 우리네 인생은 교감과 부대낌의 연속이다. 주변은 바람 잘 날 없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괜한 어제 일을 떠올리고 내일을 염려하며 술잔을 기울인다. 어른이 되어버린 나는 현관 안팎 어디서도 피할 곳이 없다. 그래도 가끔 떠나는 오지 여행은 잊었던 나를 돌아보고 유쾌한 내일을 꿈꾸게 한다. 2017년 가을 문턱에 발칸반도 인접한 알바니아로 발길이 향했다. 깃발 여행이 아니다. 식량과 장비를 짊어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 정해진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서바이벌 레이스이다.
레이스의 여정은 알바니아 중부 내륙도시 베라트를 출발해 5박 6일 동안 그리스 로마 유적을 품은 부트린트까지 220km를 달려야 한다. 코스 대부분은 흙과 자갈과 초목이 교차하는 거친 임도에 누적고도 8천m가 넘는 가파른 산야를 오르내릴 것이다. 9월 8일 오후 2시 40분, 인천공항 활주로에 KE 931편 비행기 엔진이 불을 뿜었다. 나는 아무 것도 두렵지 않다. 거창한 출정의 의미도 없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흥분과 설렘만 있을 뿐이다.

14시간을 날아 밤 11시 30분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 「마더 테레사 국제공항」에 안착했다. 테레사 수녀가 바로 알바니아 태생이라고 한다. 날씨는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알바니아는 1992년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외부 개방을 거부한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였다. 1998년 인접 국가인 세르비아의 자치주에서 발생한 코소보 사태도 알바니아와 무관하지 않다. 히틀러만큼 악명 높은 밀로세비치에 의해 분리 독립을 염원하는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인종청소 하듯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으니 말이다.
한밤중 독일 운영진과 합류한 후 4시간 쪽잠을 잤다. 시차 때문인지 어깨가 뻐근하고 피로가 몰려왔다.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티라나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베라트로 향했다. 베라트는 알바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전략적 요충지로 지금은 아름다운 성채와 수많은 건축물을 간직하고 있어 ‘박물관 도시(Museum City)’로 불린다. 가는 도중 비가 오락가락했다. 옆자리의 러시아 선수 쥴리아가 계속 말을 걸다 내 반응이 별로이자 제풀에 지쳐 잠들었다.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정오를 넘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베라트 성곽에 도착해 가장 높은 요새에 설치된 베이스캠프에 여장을 풀었다. 이제 26개국 61명의 선수(남 37, 여 24)들이 한배를 탔다. 오후 2시, 멈췄던 비가 다시 쏟아졌다. 순식간에 캠프 전체가 빗물에 잠겼다. 지뢰는 밟으면 터진다.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다. 서둘러 언덕으로 피신했다. 15년 사막 오지레이스 중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아! 등산화가 물에 젖으면 완주는 장담할 수 없는데….’ 내일 레이스가 제대로 진행될지 염려가 앞섰다.

9월 10일 새벽 3시, 베라트의 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스산한 기운을 안고 텐트로 들어와 눈만 껌뻑이다 여명을 맞았다. 레이스 첫날 아침, 부산한 출정준비를 마치고 성곽 아래 도로의 출발 선상에 섰다. 오전 8시 5분, 선수들의 환호성 속에 대회 운영자인 스테판의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모두 뛰었다. 나도 뛰었다. 산으로 연결된 임도로 들어서자 종전의 모습과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황량한 산야와 무성한 잡초, 가끔 눈에 띄는 폐가와 거친 풀을 뜯는 양 떼. 가파른 노면이 굽이굽이 이어졌다.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를 품고 급경사의 산악지역을 정신없이 기어올랐다. 내리막은 요원했다. CP마다 운영 요원들이 선수들의 물 보충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출발을 허락했다. 아니나 다를까 고개를 쳐들자 우람하게 치솟은 산 정상이 쏟아질 선수들을 응시했다. 오후 2시 50분, 5시간 가까이 38km를 달려 Buze 마을로 들어서자 캠프가 설치된 언덕 위 폐교가 시야에 들어왔다. 빨리 들어가야 괜찮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교실 안팎에 쌓인 땔감 나무에서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유난히 캠프가 멀게 느껴진 하루였지만 진한 커피 한잔으로 지친 심신을 위로했다.

레이스 둘째 날, 새벽녘까지 내린 비로 온 대지가 젖었다. 밤새 퍼붓는 비 때문에 잠만 설쳤다. 31km의 주로는 남으로 Gjirokaster를 향했다. 협곡을 가르며 우렁차게 토해내는 물줄기가 주변 토사까지 사정없이 집어삼켰다. 모두 힘이 넘치는지 선수들이 마구 내 옆을 치고 나갔다. Gjirokaster 지역은 돌의 도시(City of Stone)로 불릴 만큼 온통 바위와 돌투성이였다. 머리통만 한 돌무더기가 즐비한 수십km를 잔인하게 기어올랐다. 낯선 환경에서는 평범한 것도 특별하게 보인다. 켜켜이 쌓인 거대한 산허리 단층으로 수천만년을 견뎌온 풍파의 흔적이 온전히 드러났다.

정작 등을 떼밀어주는 바람을 타며 내리막길에 섰어도 반갑지 않았다. 비탈길을 뛰어 내달리는 건 무릎이 절단 나는 지름길이다. 나는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없다. 꺼드럭거리는 기록 단축보다 나는 더 오래, 더 멀리 달리고 싶을 뿐이다. 묵직하게 느껴졌던 등산화가 언제부터 나와 한 몸이 되었다. 오후 1시 25분, 깊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자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레이스의 종지부가 멀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다.
레이스 셋째 날, 55km를 달려야 한다.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이다. 새벽 6시, 선수들이 여명을 가르며 마을 공터의 출발 선상을 떠났다. 정오를 지나 거친 초원으로 들어설 때쯤 오락가락하던 비가 멈췄다. 대신 구름 사이 숨어있던 태양이 선수들을 넘보며 수시로 열기를 쏘아댔다. 산허리의 좁은 길을 따라 아슬아슬한 레이스가 이어졌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모든 게 끝장이다. 스틱을 번갈아 찍으며 온 힘을 쏟았다. 휘청거릴 때마다 스틱에 온 몸을 의지한 채 거친 숨을 토해냈다. 낯선 곳에서의 어설픈 몸짓과 몸을 사리는 반사작용이 본능적으로 반복됐다.
오지레이서 | 김경수
서울강북구청(팀장) 근무, 선거연수원초빙교수, 제31회 청백봉사상 수상, <내 인생의 사막을 달리다> 출간, 블랙야크 셰르파
gskim3@ga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