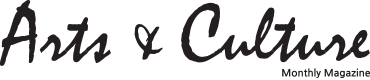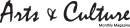[아츠앤컬쳐] 입소문만으로 100만 명 이상을 모은 공포영화가 있다. 데이비드 샌드버그 감독의 <라이트 아웃>이다. 언제든 시간에 맞춰 가면 자리가 있을 영화라 생각하고 예매하지 않았는데, 표가 앞자리밖에 남아 있지 않아 의아했다. 극장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괜찮은 영화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내가 호러 영화 매니아가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 기대 이상이었다. 설정도 좋았다. 불이 꺼지면 나타나고 불이 켜지면 사라지는 공포스런 존재가 있다는 간단한 설정이다. 그 존재는 엄마 소피(마리아 벨로)의 어릴 적 친구인 다이아나(알리시아 벨라-베일리)인데, 빛이 닿으면 살이 타들어 가는 희귀한 병을 앓고 있다(영화 소개 시놉시스를 보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감독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썼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움직임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유령급 수준이다.
공포는 모르는 것에서 나온다.
골목길을 돌아갈 때 거기 누가 있는지
알면 놀랄 이유가 없다.
아무 생각없이 지나갈 때 불쑥 나타나야
평온이 깨지고 오싹하는 공포를 느낀다.
특히 어둠 속에서 나타나면 더욱 놀라게 된다. <라이트 아웃>에서도 관객이나 희생자나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누구인지-중간에 설명이 나오지만 그것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왜 그렇게 사람을 해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
영화는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마네킹 회사에서 시작한다. 여직원 에스더(로타 로스턴)는 사무실 불을 끄다가 누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양아들 마틴(가브리엘 베이트먼)과 통화를 하고 있는 사장 폴(빌리 버크)에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우리는 에스더가 벌써 네 번이나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공포스런 존재를 봤기 때문에 무시할 일이 아니라 생각해 걱정한다. 물론 공포 영화의 기본이 관객이 걱정하는 바를 출연자가 그대로 꿋꿋하게(?) 실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감독의 역할은 무엇일까? 어떤 의도를 갖고 영화를 만드는 것일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공포영화에 충실하게 관객을 놀라게 하고 스릴을 맞보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 후자라면 감독이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까? 설령 전후반의 일관성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래, 곡성처럼 현혹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혹된 사람들이 항의할 것은 아니지 않나?
아들 마틴은 어느 날 엄마가 화장실 안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다가가 엿본다. 그런데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깨웠니?”라고 묻는다. 여기서부터 오싹한 느낌이 증폭되기 시작한다. 분명 뭔가 있는데, 그래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엄마가 ‘내가 깨웠니?’라고 묻는 대신 ‘우리가 깨웠니?’라고 말했으니 말이다. 집안에 마틴과 엄마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관객에게 ‘아, 정말 뭔가 있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 준다. 이로써 감독의 기본 설정의 틀이 완성되는 것 같다. 어둠 속에서만 나타나는 존재가 있다는 것과 그 존재를 엄마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우리’라는 말로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다.
이제 관객들은 감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어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실제로 여기면서 미스터리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그러나 감독은 뭔가 나중에 전체 이야기의 아귀를 맞출 복선을 살짝 깔아 놓는다. 마틴이 누나 레베카(테레사 팔머)에게 엄마가 다이아나라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자, 그녀는 다이아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엄마가 지어낸 것이라고 말한다.
엄마와 이야기를 하던 레베카는 엄마가 항우울제를 거르는 것을 알게 된다. 항우울제? 그렇다면 엄마가 정상이 아니지 않나? 이런 복선들을 약하게 살짝 깔자마자 영화는 다시 공포스럽게 다이아나를 등장시킨다. 우리는 그녀가 정말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 이들 가족에게 그녀가 나타나는지와 그녀의 의도는 무엇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영화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고 쫄깃쫄깃한 공포를 화면 가득히 뿜어낸다. 물론 이 모든 공포는 우리가 만들어낸 전제들을 통해 더욱 밀도를 더하고 있지만 말이다.
영화의 중간에 엄마가 도움을 요청할 때와 마지막에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린 도대체 다이아나와 엄마의 관계가 무엇일까 다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둘은 같은 존재일까?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 다이아나가 치료 중에 죽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어떻게 죽은 존재가 실재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소개 줄거리에 다이아나가 실재한다고 나오지만 다 보고 난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사람을 놀래킬 수가 있구나.’ 하면서 극장을 떠났다. 감독은 줄거리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관객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글 | 강인식
전 KBS, SBS PD, 전 싸이더스FNH 대표, 현 kt미디어 콘텐츠담당 상무
ilpas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