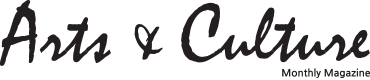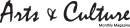[아츠앤컬쳐]
오매 단풍들것네 -김영랑
"오매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붉은 감잎 날아오아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
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리니
바람이 잦이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 들것네."

커튼을 닫고 등을 켜면 계절도 시간도 모른 채 붓을 들고 화폭에서 헤엄을 친다. 바깥세상과 나의 통로인 TV가 1980년대 농촌으로 나를 자꾸 데려다 놓는다. 흐릿한 컬러화면에 리어카랑 소가 등장하던 전원 풍경은 내가 1975년에 딱 한 번 본 시골 큰집 동네랑 비슷했다.

어린 눈에는 바다만큼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아니더라도 야트막한 기와를 얹은 담벼락 끝에 닫힌 듯 열린 듯 누구든 들어오라는 보이는 나무대문에, 오래된 먼지가 잔뜩 낀 대청마루, 마당저 쪽에 있는 뒷간, 헛간, 외양간...보기에는 정겨워도 살기엔 불편한 그 시골. 그래도 늦여름인지 초가을인지 나이도 제각각인 동네 언니오빠들 여럿이 모여 어느 집 바깥인지 마당인지 아궁이에 마늘을 통째로 넣고 구워서 시커먼 손으로, 간식으로 '줄줄이사탕'이랑 '왔다초코바'나 사먹던 낯선 나에게 나눠주며 먹던 장면, 낮은 언덕길을 큰집의 언니가 끌고 내달리는 리어카에 나를 포함한 어린애들이 올망졸망 올라타서 소리를 지르며 타고 열 살 근처 아이들은 리어카를 따라 뛰던 그 추억을 떠올리며, 사람, 풍경, 생각이 너무나 진짜 우리네 같아서 울고 웃으며 지난 연속극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내 작품에 미래를 담고 어지러운 세상을 담고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내 삶이 원대한 포부와 목표로 피곤해지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누구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누구의 노력으로 나의 지금이 있는지 뒤돌아보고 싶었다.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봤던 하늘, 땅, 물이 내가 보는 그것들과 같을 것이다.
한 점 한 점 붓이 닿은 화폭에는 촌스러운 붉은 해초 사이를 노오란 물고기가 파란 하늘빛을 머금은 물속을 한가롭게 돌아다닌다. 공포스러운 자연의 형벌에 발이 묶여버린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뜨거운 햇살을 느낄 겨를도 없이 높아만 가는 하늘이 계절이 바뀌었다고 알려준다. 지난 봄 벚꽃이 끝없이 흐드러지게 피어도 봐줄 이는 나 혼자밖에 없던 시골 큰집 옆 강줄기 닮은 큰 냇가의 그 나무들이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고 있으려나... 나는 못가도 내 물고기들은 자유롭게 단풍 사이를 왔다 갔다 하라고 화폭 가득 가을물을 들인다. 오매, 단풍 들것네!
그림·글 | 채현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