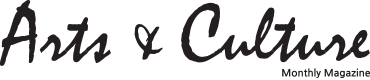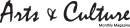[아츠앤컬쳐] 가끔 언론사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만약 쇼호스트가 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의 대답은 “그래도 쇼호스트죠.”다. 그러면 기자는 재미없다는 듯이 또 질문한다.
“아니…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방송일도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다른 쪽이요. 이쪽 일과 전혀 다른 일.”
“그럼 패션이죠. 아마 패션 쪽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방송국 시험에 줄줄이 떨어지고 나서 프랑스 파리로 패션 공부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다. 어렸을 때부터 밥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아나운서 흉내를 내고 그랬던 시간만큼 옷 만들기를 좋아해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잘라서 인형 옷을 수시로 만들곤 했으니까. 파리 유학 준비를 하다가 케이블 시범 방송국에 아나운서로 취직이 되면서 유학을 포기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방송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 있을 것 같다.
패션을 좋아하고 남을 따라 하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 나는 확실히 유행과는 다르게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 내가 입고 다닌 옷 스타일이나 즐겨 사용한 패션 아이템이 2~3년 뒤에 유행이 되기도 한다. 남이 선뜻 선택하지 않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아이템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나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브랜드 중의 하나가 플리츠 플리즈(pleats please)다.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을 많이 선보이는 이세이 미야케가 세컨드 라인으로 플리츠 프리즈를 처음 내놓았을 때 지금까지 봐 왔던 옷들과는 완전히 달라서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구김이 많이 가는 옷을 입기 싫어한다. 구김 간 옷은 깔끔해 보이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후줄근해 보여서 조금이라도 주름이 생기면 잡힌 주름을 펴려고 안절부절못하게 된다. 그런데 플리츠 플리즈는 옷을 아예 쪼글쪼글 구겨버렸다. 온통 주름밖에 없는 그 옷이 어찌나 독특하고 신기해서 마음에 들던지…
극도의 편안함은 입체 재단에서 시작된다며 수많은 고급 브랜드들이 수백 개의 조각으로 만든 입체 재단 옷을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입체 재단을 선호할 때 플리츠 플리즈는 전혀 엉뚱한 평면 옷을 내놓았다. 마치 어릴 때 내가 즐겨 만들던 종이 인형 옷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트 없고 절개 별로 없고 그냥 바닥에 놓으면 종잇장처럼 바닥에 철썩 달라붙는 납작한 옷. 세상에 어떻게 이런 옷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옷을 손으로 당겨보니 주름이 아코디언처럼 쫙쫙 늘어난다. 플리츠 플리즈는 수백 개의 입체 조각을 대신하는 수천 개의 주름으로 만들어진 옷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본 신기한 옷에 감탄해 30대 초반 나이에 플리츠 플리즈를 사서 입고 다녔다. 고무줄 밴드 바지의 편안함은 말할 것도 없고 굵어진 팔뚝 살, 허벅지 살 잘 가려지고 쫙쫙 늘어나 주니 정말 좋았다.
그런데 10여 년 전 어느 날, 30대 내 또래들은 언감생심 입을 생각도 안 하는 플리츠 플리즈가 독특하고 편해서 입고 신 나게 나갔던 모임에서 한 남자 분이 왜 몸빼바지를 입고 왔냐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 플리츠 플리즈라고 말했더니 “뭐요? 제발 제발(please please)이라고요?”라고 되묻는 바람에 완전히 언짢아져서 그 모임에 발길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몸매가 푸짐한 강남 사모님들이 입고 있는 모습이 하나 둘 씩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30대 젊은 강남 사모님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져 친정엄마에게 입으시라고 드렸다. 엄마의 군살을 눈 깜짝할 사이 가려주고 은근히 부티나는 느낌까지 더해져 역시 플리츠 플리즈는 친구 말대로 강남 중년 사모님들에게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급스러운 몸빼바지(이세이 미야케가 이 소리를 들으면 기절초풍하시겠지만)이기에 넉넉한 몸매의 강남 사모님 패션 전유물이라는 느낌을 버리지 못해 나의 기억 속에서 플리츠 플리즈를 지운지 몇 년이 지났다. 나중에 나이 들어 중후한 외모에 사모님 소리 들을 때 즈음이면 다시 입어보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갤러리아 명품관에 갔다가 커피숍에서 날씬하고 젊은 30대 초반의 여성이 플리츠 플리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을 뗄 수 없었다. 내가 그녀만 한 나이였을 때 입었던 그 주름 바지가, 몸빼바지라고 이야기 들은 그 바지가 그녀의 차림새에서는 어찌나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이던지… 짙은 블루 팬츠에 눈이 부시도록 채도와 명도가 높은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남달라 보이던지…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나의 눈은 힐끔힐끔 그녀에게로 향했다.
급기야 며칠 뒤 몸빼바지라는 기억을 버리지 못했던 플리츠 플리즈를 10여 년 만에 다시 사고 말았다. 입는 순간 내 몸에 독특한 촉감으로 휘감기듯 흘러내리는 주름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래! 바로 이 느낌이야!”
플리츠 플리즈로 차려입은 나를 보고 패션에 문외한인 그 누군가가 몸빼바지라 하든 아니면 돈 많은 강남 사모님 패션이라고 말하든 나에겐 플리츠플리즈는 플리츠 플리즈(pleats please)다. 한동안 플리츠 플리즈를 멀리한 시간만큼 불어난 내 군살과 주름을 다정하게 숨겨주고 어깨동무해주는 옷! 생각보다 플리츠 플리즈를 다시 입는 날이 좀 일찍 왔다. 그건 내가 나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플리츠 플리즈가 젊어졌고 플리츠 플리즈를 바라보는 시선도 젊어졌기 때문이다.
패션을 예술로 승화시킨 ‘소재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일본 3대 대표 디자이너중의 한 사람,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그가 만든 세컨드 라인 플리츠 플리즈(Pleats please)는 신체와 의복 사이에 공간을 남겨주어 옷으로부터 나를 숨을 쉬게 해준다. 벗어놓으면 종이같이 납작해지는 평면 옷이 입체 재단된 옷만큼 편안한 이유다.
유난희
명품 전문 쇼호스트, 저서 <명품 골라주는 여자> <아름다운 독종이 프로로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