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츠앤컬쳐] ‘르네상스’하면 우리는 메디치 가문을 먼저 떠올린다. 르네상스와 메디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융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귀족이나 왕족이 부럽지 않은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다. 그런 메디치 가문이 예술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예술가들을 후원한 배경이 늘 궁금했었는데 사회학자 노명우 교수의 <두 번째 도시, 두 번째 예술> 책을 읽다가 궁금증이 조금 풀렸다. 다분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지만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있었기에 문화예술의 꽃이 피렌체에서 다시 활짝 피게 되었다는 생각이다.
오늘날 아쉽게도 메디치 가문의 직계는 대가 끊겼지만 가문이 소유했던 수많은 예술 작품들은 피렌체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피렌체 시에 기증되어 우피치 갤러리에 소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피렌체를 찾아와서 메디치 가문의 소장품을 감상한다. 1년에 피렌체역을 드나드는 사람이 8천만 명이라는 통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피치 갤러리를 찾아오는지 가늠할 수 있다.
<두번째 도시 두번째 예술>에서 3장 '1453년 5월 20일 콘스탄티노플이 사라지던 날의 피렌체' 중 일부를 소개한다.
메디치는 귀족도 왕족도 아니다. 그들은 평민이다. 하지만 돈은 평민 내부에 또다른 계층을 만든다. 메디치 가문은 귀족이나 왕족도 넘볼 수 없는 부를 지녔다. 부는 언제나 그랬듯 위력을 발휘한다. 돈의 힘으로 그들은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하지만 돈의 힘은 매우 위태로웠다. 권력을 세습받는 귀족이라면 시민의 평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돈의 힘에 의지한 권력자인 메디치 가문에게 평판 유지는 권력 유지의 핵심 요소였다. 평판 유지에 실패하면 추방당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메디치 가문은 추방과 복귀를 반복했다. 좋은 평판을 획득할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피렌체 시민의 공통분모인 신앙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이었고, 두번째 방법은 피렌체를 예술로 표현하는 일이었다. 코지모는 “기독교적 헌신과 세속적 명예욕이 충돌할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예술과 건축”임을 간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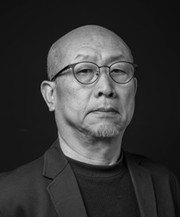
글 | 전동수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