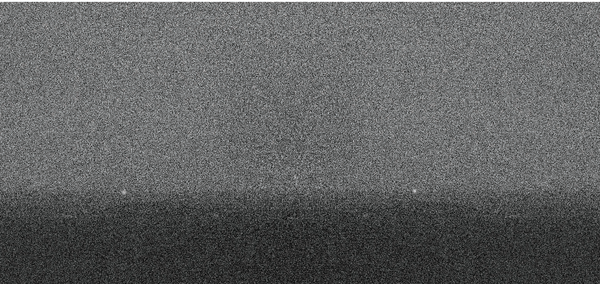
[아츠앤컬쳐] “검은 것은 우주 만물을 잉태(孕胎)하고 있는 어머니이고, 회색과 가물가물함은 정신적 자유를 얻고자 함입니다.”
피안(彼岸)은 차안(此岸:현세)의 상대어로서 불교에서는 세속으로부터 초월하여 해탈에 이르는 것으로 번뇌에 얽매인 생사고해(生死苦海)를 넘어선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涅槃)’을 이르는 말이다. 이것은 촛불을 불어 끈 상태로도 비유되는데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지혜로 꺼서 참 진리를 깨닫고 완전한 정신의 평안함에 놓여진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완교(1940~) 작가의 대표작 피안(彼岸:Nirvana_ Beyond Dark)은 한국의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도가사상(道家思想)을 메인 콘셉트(Concept)로 하고 있다. 그는 “도가적 정신은 어떠한 언어나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창작정신과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 한다. 기운생동(氣韻生動), 무념무상(無念無想) 등 지금까지 작가가 평생을 두고 진행해 온 작업들은 모두 동양의 노장사상(老莊思想)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작가는 동양사상을 황폐해진 인간의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해답으로 생각했던 독일의 문인 노발리스(Novalis)의 말에 주목하며 자신 또한 힐링(Healing)의 예술로서 그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음을 피력했다.

강원도 삼척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이완교 작가는 바이올린(Violin)을 전공하고 국내 유수한 기관의 합창 지휘자로서 활동하던 중, 돌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진가로 전향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1세대 사진작가이다. 그는 “음대 재학시절, 레슨비를 모아 카메라를 구입하고 낮에는 사진을 찍고 밤에는 연주를 하면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전공과 사진을 병행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 한다. 결국 작가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술로서의 사진의 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시 사진계에 만연해 있던 문화적 사대주의(事大主義)에서 벗어나 사진예술을 통해 ‘한국적인 미학(美學)’을 세계무대에서 실현해 보이겠다는 ‘대붕(大鵬)의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과 예술로서의 사진의 재현방법에 대한 탐구,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품은 자신만의 예술적 형식을 만들기 위해 지난 37년간 동서양의 철학과 미학, 종교학, 무속학 등을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로서의 확고한 정체성(Identity)을 구축해 가고 있다. 프랑스의 예술계(Art Market)에서는 이러한 이완교 작가의 동양적이면서도 유니크(Unique)한 작품에 주목하고 그를 2014년 프랑스 낭시(Nancy)에서 개최되는 제18회 국제이미지비엔날레에 대표작가로 초청하여 프랑스 문화부 등의 기관과 참여관객들에게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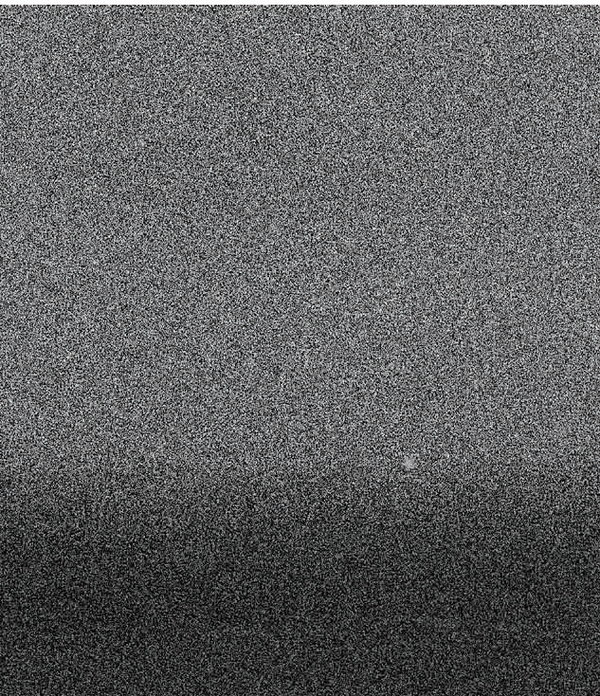
그의 사진은 Zone 0에서 Zone 5까지의 계조(Zone System : 순흑(full black)에서 순백(pure white)까지의 톤을 농도별로 10단계로 나눈 것)만을 사용하여 낮은 콘트라스트(Low Contrast)의 어둡고 중량감 있는 톤(Tone)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고 밝아진다. 작품에서 생략된 Zone 6에서 Zone 10까지의 계조가 관람객의 심상(心象)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 안개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로서 공중에서 사라지는 연기처럼 윤곽선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번지듯 그리는 공기원근법인 스푸마토(Sfumato) 기법의 적용은 장면의 심오한 깊이와 가까운 듯 멀고 먼 듯 가깝게 느껴지는 동양의 심상적 거리감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적 효과는 작가가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검정(Full black)과 회색(Gray) 그리고 가물가물하고 아련한 이미지를 ‘도가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중심코드’로 만들기 위한 장치이다.
노자의 도덕경 14장에 나오는 이(夷), 희(希), 미(微)는 작가의 중심철학이다.
보아도 보지 못하므로 ‘이(夷)’라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므로 ‘희(希)’라 하며
잡아도 잡지 못하므로 ‘미(微)’라 한다.
이 셋은 따로 무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섞여 하나로 어울리더라.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으며,
끝없이 이어져 이름 지을 수 없고,
무엇이 없는 데로 돌아간다.
이를 형상 없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물질이 아닌 형상이니 이름하여 ‘황홀(恍惚)’이라 한다.
눈의 집착을 버리고 작품을 마음에 비추니 작가가 지휘하는 조화로운 합창의 선율이 여기와 저기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나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와 그의 작품을 보는 내내 나의 마음도 황홀하였다.
글 | 김이삭
전시기획자, Art Director, (주)이삭 아르테포베라 대표
director@issac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