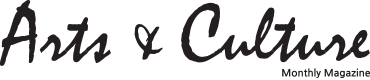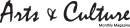숙명의 라이벌
‘바그너’와 ‘베르디’의 200년 전쟁

[아츠앤컬쳐]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 그들의 삶은 시차를 두고 그들의 인생 그리고 죽음까지 정확히 반복했다는 평행이론은 클래식 월드에도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마도 클래식의 세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숙명적 라이벌 존재의 반복적 등장 때문이 아닐까?
내게 매우 흥미로운 스토리로 다가왔던 얘기를 하나 풀어 보자면,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와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헨델’, 그들은 서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지만 1685년 같은 해에,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 바로크 시대 음악의 거장들로 우뚝 서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클래식에 문외한인 사람들에게조차 익숙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위대한 음악가들이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전혀 다른 나라에서 활동했던 두 음악가가 하필이면 같은 돌팔이 안과의사에게 수술받고 둘 다 실명하는 어이없는 비운의 주인공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평행이론처럼 등장한 인물들이 후대에 등장했으니, 전 세계의 모든 클래식음악가와 기획자들을 10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빅 이벤트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는, 2013년 탄생 200주년 기념의 해를 맞는 ‘바그너’와 ‘베르디’이다.
히트작 제조기였던 오페라계의 이 두 거장은 1813년 같은 해에 태어났고 이탈리아 오페라와 독일 오페라 양대 산맥이 되었다. 그들이 태어난 곳은 로마 시대 이후 나뉘어 정식적으로 통일국가의 지위를 갖지 못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향권 하에 있던 한 지방 정부였을 뿐이었다.
두 작곡가의 공통적인 민족주의적 영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국가에 대한 열망을 자극했고 그 때문에 둘은 음악뿐 아니라 적극 정치적 활동에도 참여했다. 국제적 활동 면에서도 그 당시 헝가리 제국과 더불어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프랑스에 초청되어 ‘파리오페라극장’에서 바그너는 ‘탄호이저’를 베르디는 ‘돈 카를로스’를 올리게 되는 영광도 함께 얻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작품에도 불구하고 파리 관객들의 텃세에 눌려 두 작품 모두 조기종연 해야 했던 공통의 아픔도 공유하고 있었으니 이 두 음악가도 서로 흡사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음악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색을 당당히 주장하던 그들이었지만…
세상의 한가운데 쌍둥이 천재들이 이 땅에 보내졌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음악으로 수백 년 동안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 음악과 더불어 전해지는 특별한 스토리는 우리에게매우 흥미로운 음악감상의 또 다른 즐거움을 전해주니 이것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닌가!
전 세계적인 클래식 시장의 침체기 속에서 한줄기 빛처럼 돌아온 이들을 두고 세계적인 음악 단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주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공립 단체들을 포함하여 2013년, ‘바그너’와 ‘베르디’ 프로그램들을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필자만 하더라도 올 한해를 시작하는 신년음악회부터 ‘바그너’와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 아리아를 노래할 예정이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를 등에 업고 관객들과 나눌 교감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뛴다.
2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 정도로 떠들썩한데 그들이 실존했던 전성기에 올려진 대형공연들은 관객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흥미로운 선물이었을까? 2013년 200살의 ‘바그너’와 ‘베르디’의 운명적인 재대결이 벌써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제 우리는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팸플릿을 우아하게 들여다보며 두 작곡가를 대신하는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흐르는 음악의 전율에 몸을 맡겨보도록 하자.
이상주의 ‘바그너’? 아니면 실용주의 ‘베르디’?
과연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인가?
신금호
성악가, 오페라 연출가,
반포아트홀 M 예술감독, 오페라M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