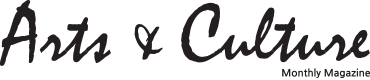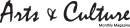café de flore

[아츠앤컬쳐] 북회귀선의 작가 헨리 밀러는 생 제르망 데프레가 사라지는 날 프랑스는 달랠 길 없는 미망인이 되고 그 뒤 오래 살지는 못 할 거라 했던가! 파리 생 제르망 거리의 카페 드 플로르. 근처의 레 뒤 마고와 함께 파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곳. 문인과 화가들 그리고 명사 등… 많은 히스토리는 생략!
1975년도의 어느 이른 아침 패션사진가 쟝 루프 시에프가 카페 드 플로르 노천 쪽에 자리를 잡고는 커피를 한 잔 시킨다. 21mm 렌즈를 부착한 그의 라이카 M 블랙 바디를 만지작 만지작거리던 중 생 제르망 데 프레 쪽을 향해 길을 건너가는 검정수트 차림의 남자를 보면서 클릭! 남자의 두 다리는 모두 허공에 떠 있다.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에서 250분의 1초 사이.

카페의 안쪽에서 셔터를 누른 것을 증명하듯 카페 드 플로르의 카페 드 글자만 반전되어 찍히고 주문한 커피나 카페오레가 나오기도 전인지 빈 테이블 위의 재떨이가 함께 찍힌 초광각 사진. 이 한 컷의 흑백사진 때문에 나는 이곳을 정말이지 좋아한다. 커피를 별로 안 마시는 나는 시트롱 프레세를 주문한다. 스쿼쉬된 생레몬즙 한 잔과 따로 담긴 냉수 한 컵 그리고 설탕이 영수증과 함께 서빙된다. 이때 살짝 부탁하면 싱싱한 올리브도 자그마한 접시에 특별 대령.
아르마니, 라거펠트 등 패션계의 거물들도 파리에서 커피 맛이 제일 좋다는 플로르의 단골고객이라는데 그들도 그들이지만 알랭 들롱이나 이자벨 아자니 아님 티나 터너라도 한 번쯤 건너편 테이블에 안는 행운이 오지 앉을까 하여 오른편에 놓인 카메라는 항상 렌즈가 앞을 향하게 둔 채 이리저리 시간을 때워 보지만 십중팔구 별 볼 일 없이 시간이 흐르고 만다.
갸르송(급사)을 불러 팁과 함께 계산을 치른 뒤 다음을 기약하며 자리를 뜨게 되는 카페 드 플로르. 파리의 전형적인 으스스한 날엔 시트롱 프레세보단 쇼콜라를 시키는 게 탁월한 선택이다. 그래도 난 역시 시트롱 프레세. 요즈음엔 설탕을 안 섞고 신 채로 그냥 마신다.
글 | 케이티 김
사진작가, 패션계의 힘을 모아 어려운 이들을 돕자는 Fashion 4 Development의 아트 디렉터로 뉴욕에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