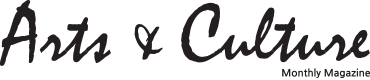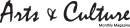[아츠앤컬쳐] 일주일이 멀다 하고 클래식 공연장을 찾을 때마다 듣는 공연장의 안내방송이 있다. 이제 공연이 시작되니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고 음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치지 마시고 연주자가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를 하면 박수를 쳐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항상 아무 생각 없이 박수를 치는 관객을 만나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다.
어쩌다가 박수를 치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시도 때도 없이 박수를 쳐대는 관객을 보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사실 박수를 많이 쳐 주는 게 연주자에게는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일이지만 음악의 흐름을 방해하는 박수는 자제하는 게 좋은 데 어디서 박수를 쳐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니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잘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눈치도 없고 언제 박수를 쳐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사고를 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교향곡(symphony)은 대개 4악장으로, 협주곡(concerto)은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악장마다 리듬이나 템포 그리고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쉬는 부분이 있다. 이런 쉬는 부분도 음악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종류가 다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입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셔벗(sharbet) 종류의 얼음 빙수를 먹는 경우처럼 음악에서 쉬는 부분은 이런 셔벗의 기능을 대신해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오페라의 경우에는 박수를 치는 빈도가 더 높다. 오케스트라의 서곡이 끝났을 때나 주역 가수의 독창(아리아)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박수를 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공연에 동원된듯한 사람들의 무분별한 박수가 그것이다. 자기 스승이거나 동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박수를 치고 브라보를 외치는 장면을 대할 때마다 매우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언젠가 오페라를 관람하는데 무대 뒤에서 공연에 출연한 합창단원들이 자기 지도교수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브라보를 외치면서 박수를 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했다. 한국관객처럼 박수를 후하게 쳐주는 나라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잘하면 잘했다고 열심히 박수를 쳐주고 잘못했어도 앞으로 더 잘하라고 용기를 주기 위해 박수를 친다. 더군다나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구분을 못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박수를 치는 경우도 흔하다.
필자의 기억으로 공연장의 안내방송이 적어도 십여 년 이상 계속되고 있지만 제대로 박수를 치는 관람문화가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공연장의 관객이 누구냐에 의해 그 공연의 품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공짜 티켓이 많이 뿌려지는 공연에서는 어김없이 ‘용감한 관객’을 만나게 된다.
글 | 전동수 발행인
2007년부터 카자흐스탄 잠빌국립극장 고문을 맡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음악평론가, 대한적십자사 미래전략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리고 한신대학교 서울평생교육원에서 ‘전동수의 발성클리닉’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