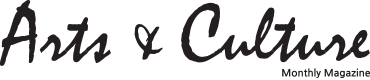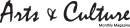[아츠앤컬쳐] 1842년에 창단되어 171년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구스타프 말러,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브루노 발터, 레너드 번스타인, 주빈 메타, 그리고 로린 마젤과 같은 당대의 거장들과 함께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뉴욕 필하모닉이 2009년에 취임한 상임지휘자 앨런 길버트와 내한 공연을 가졌다. 뉴욕 출신인 앨런 길버트는 뉴욕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또 한 번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필하모닉의 연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찾았다.
2014년 2월 7일 오후 8시, 뉴욕필(Phil)에 뉴욕필(Feel)을 불어넣는 지휘자 앨런 길버트가 오늘 저녁에 들려준 사운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스럽다. 우선 공연 시작 전부터 모든 단원이 무대에서 자유스럽게 연습을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전부 미국 작곡가의 작품이다.
크리스토퍼 라우즈(오케스트라를 위한 ‘랩쳐’), 레너드 번스타인(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조지 거슈윈(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랩소디 인 블루’ /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시 ‘파리의 미국인’)의 음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유럽의 정통 클래식에 비해서 음악적 감동의 깊이는 덜하지만 편안하게 음악에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이날 합창석을 포함해서 콘서트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공연의 품격을 높여 주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의 휴대폰 벨소리가 잠시 공연장을 긴장시킨 것 외에는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가 된 부족함이 없는 공연이었다.
앵콜로 준비한 메노티(Menotti)의 ‘아멜리아 무도회에 가다’(Overture to Amelia Goes to the Ball)와 슈베르트(Schubert)의 Rosamunde Entr’acte No.5 두 곡이 아주 좋았는데 마지막 곡인 슈베르트의 ‘INTERMEZZO’가 준 음악적 감동으로 이날의 알 수 없는 갈증을 해소시켜주었다.
지휘봉을 잡은 동양적인 마스크의 음악감독 앨런 길버트(Alan Gilbert)는 큰 체구에 비해 매우 유연하면서도 섬세한 몸짓으로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미국적인 색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음악에서는 ‘자유로움’이 많이 느껴졌다. 특히 피아노 협연이 끝나고 일본인 재즈 피아니스트 마코토 오조네(Macoto Ozone)가 혼자서 짧은 앵콜곡을 연주할 때 지휘단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듣는 모습은 격식을 배제한 편안한 행동이었는데 매우 귀엽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모든 연주가 끝나고 더 이상 앵콜을 할 수 없다며 밥 먹으러 가야 한다는 소탈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제스쳐에서 솔직한 인간미가 느껴졌다.
글 | 전동수 발행인
올레tv 클래식 프로그램 ‛프롬나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음악평론가, 대한적십자사 미래전략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리고 한신대학교 서울평생교육원에서 ‘전동수의 발성클리닉’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