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스탕스의 슬픈 연가

[아츠앤컬쳐] 이별에 관하여 생각할 때 유독 떠오르는 것은 황량하고도 쓸쓸한 기차역이다. 특히 겨울밤의 기차역은 유난히 사람을 고독하게 만든다. 때때로 누군가를 배웅하는 길은 한없이 적막한데 여기 죽음의 길로 연인을 배웅한 한 여인의 노래는 그 절절한 아픔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카테리니행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11월은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으리. 우연히 레프테리에서 우조를 마시는 당신을 보았네. 비밀은
품은 당신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겠지. 기차는 멀리 떠나고 당신은 홀
로 카테리니에 남았네. 안개 속 5시부터 8시까지. 심장에 칼을 품듯 홀
로 남아 보초를 서네.”
아그네스 발차(Agnes Baltsa)의 목소리로 잘 알려진 노래 ‘기차는 8시에 떠나네(To tréno févgi stis októ)’는 그리스 특유의 애수 어린 선율에 부주키의 반주가 더해진 미키스 테오도라키스(Mikis Theodorakis)의 ‘렘베티카’이다. 돌아올 수 없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신음하듯 토해내는 이 노래는 실상은 테오도라키스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곡으로, 제2차 세계대전 시 나치 독일에 저항한 한 젊은 그리스 레지스탕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압적 군사정권 아래 수 차례 투옥되고 감금과 고문에 유배까지 당했던 테오도라키스는 작곡가 마노스 하지다키스(Manos Hatzidakis)와 함께 그리스 음악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며 자유와 평화의 염원을 음악 안에 담아냈다.
테오도라키스의 대표곡 ‘기차는 8시에 떠나네’는 국내에서도 성악가 조수미의 버전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외에도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아버지의 슬픈 고백인 ‘5월의 어느 날(Mera Magiou)’과 반독재 시위 중 희생된 학생들에게 바치는 ‘미소 짓는 소년(To yelasto pedi)’ 등 테오도라키스의 노래들은 한결같이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테오도라키스는 오페라와 교향곡, 민중가요, 대중음악과 영화음악 등 약 1,000여 곡의 작품을 통해 변화무쌍한 음악적 확장성을 보여주었으며 무엇보다 서구적 화성과 서정성으로 전통적인 렘베티카를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리스의 블루스로 통하는 렘베티카(Rembetika)는 밑바닥이란뜻을 가지며 본래 피레우스와 데살로니키 등 항구의 빈민촌에서 시작된다. 터키와의 전쟁이 종결된 직후인 1923년 로잔 조약에 따라 터키 지역에서 강제 이주된 약 150만 명의 그리스인들은 가난과 고통에 찌든 삶의 애환을 홍등가의 퇴폐적인 노래로 풀어내는데 여기엔 발현악기인 부주키(Bouzouki)의 연주와 환각적 춤인 제이베키코(Zeibekiko)가 동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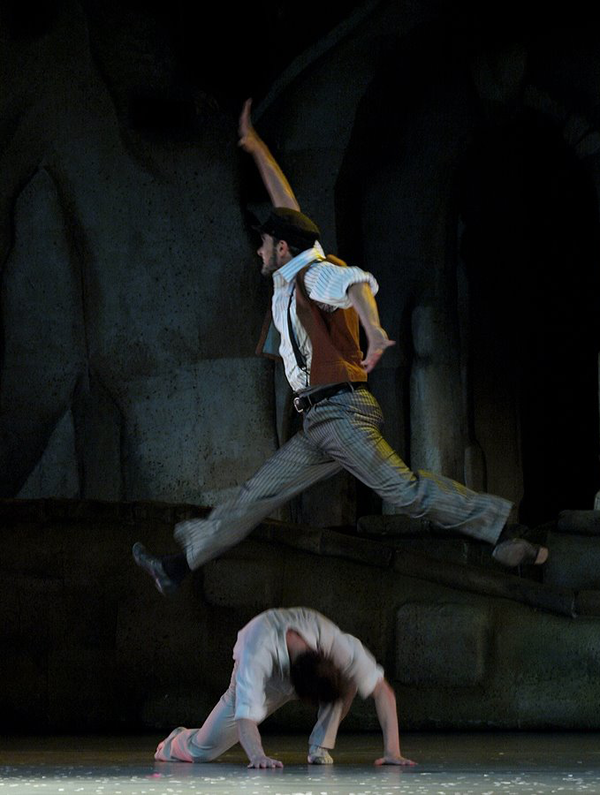
당시 술과 마약, 매춘, 밀수 등에 노출된 천박하고 퇴폐적인 내용 때문에 무시되고 금지되던 렘베티카는 서서히 작곡가 겸 부주키 연주자인 마르코스 밤바카리스(Markos Vamvakaris)와 바실리스 치차니스(Vassilis Tsitsanis)에 의해 점차 형태를 갖추게 되고 순화된 애절함이 더해지며 대중들에게 사랑받게 된다. 1960년대에 이르러 테오도라키스와 하지다키스에 의해 새로운 시적 서정성을 입은 렘베티카는 ‘예술적’ 의미의 엔테흐노(Entekhno)와 그리스적 현대성에 입각한 라이카(Laika) 장르의 탄생을 주도하며 그리스의 대표음악으로 자리매김한다.

대중의 지지를 끌어낸 테오도라키스의 렘베티카들은 한 때 그리스 내에서 모조리 금지되며 투옥과 망명 등 그에게 많은 고초를 안겨주지만, 영화감독 코스타 가브라스(Costa Gabras)와 여가수 마리아 파란투리(Maria Farantouri)와 같은 신념적 동지들과 함께 활동하며 테오도라키스는 그리스의 상징적 인물로 떠오른다. 특히 대중음악계의 칼라스(Maria Callas)로 불리는 파란투리는 가장 진솔한 그리스적 정서로 테오도라키스의 노래들을 세상에 알리는데, 애절하고도 비장한 그녀의 노래들은 렘베티카의 고전으로 불리며 하리스 알렉시우(Haris Alexiou), 사비나 야나투(Savina Yannatou), 엘레니 비탈리(Eleni Vitali), 코스타스 파블리디스(Kostas Pavlidis), 멜리나 카나(Melina Kana), 엘레프테리아 아르바니타키(Eleftheria Arvanitaki)와 같은 수많은 여성 가수들에게 전수되고 있다.
일찍이 유토피아를 꿈꾸던 하이네(Heinrich Heine)의 시 ‘노래의 날개 위에’에 꿈결같이 아름다운 곡조를 실어 보냈던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처럼 어쩌면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도 쓸쓸한 기차 한 켠에 그의 눈물의 연가를 실어 보냈는지도 모른다. 한때는 민주주의의 첫 봉오리가 피어난 자유와 평화의 조국, 그가 사랑한 그리스의 미래를 그리며.
글 | 길한나
보컬리스트, 브릿찌미디어 음악감독, 백석예술대학교 음악예술학부 교수
stradak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