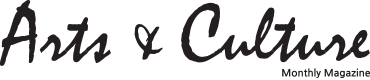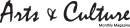[아츠앤컬쳐] 난 스무 살 때부터 수트를 좋아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당시 입사하기 어렵다는 외국계은행에 취직한 선배언니가 첫 월급으로 구입했다며 아르마니 수트를 입고 나타났을 때 그날 이후 나에게 수트는 성공한 사람의 상징이었고 인텔리전트한 모습의 표상이었다. 선배처럼 되고 싶었다. 선배는 성공한 완벽한 어른처럼 보였다.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달랑 입고 있는 아직 어리숙한 나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선배의 포스는 순전히 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다. 나도 취직해서 사회인이 되면 무조건 수트를, 물론 아르마니 수트를 입겠노라고 야멸찬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나의 첫 직장에서는 자유 복장이 아닌 유니폼을 입어야 했다. 화이트 블라우스에 블루 색상의 베스트와 스커트가 유니폼이었다. 유니폼을 입으면 외모에 신경을 덜 쓰기에 일의 능률도 오를 거라는 회사의 깊은 뜻이 있었다. 고등학생 때도 교복 자율화로 입지 않았던 제복을 사회인이 된 나이에 입어야 한다니 갑갑한 노릇이었다. 무엇보다 나의 눈에는 촌스럽기 그지없는 제복이었다. 송편 같은 카라가 얌전히 내려앉은 화이트 블라우스는 그야말로 내 취향이 아니었다. 거기에 로얄 블루도 스카이블루도 아닌 애매모호한 블루 컬러 배색이라니….

여차하면 유니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할 판이었다. 취직하면서 근무할 때 입겠다고 장만한 아르마니 수트는 출퇴근복이 되고 말았다. 출퇴근용으로 입기에는 너무 큰 거금을 썼다. 멋진 커리어우먼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나의 아르마니 수트는 1년에 한두 번 친구들 결혼식 때 꺼내 입는 제복 아닌 제복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수트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아 백화점에 갈 때면 항상 매장을 기웃거리며 또 수트 구경을 했다.
20대에 시작된 수트 사랑은 30대에도 계속됐다. 그러다 내가 수트에 대한 애정이 식기 시작한 것은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스무 살 시절에는 수트를 입으면 어색한 듯 어색하지 않은 어른티가 나는 게 좋았다. 수트로 보여지는 성숙한 느낌이 좋았다. 그런데 40을 넘긴 어느 날 수트를 차려입은 거울 속의 나에게서 삶에 지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화들짝 놀라 수트를 벗어버리고 말았다. 스무 살에는 멋있어 보이고 근엄해 보이던 어른스러운 수트가 왜 갑자기 나이 들어 보였을까? 수트 입기가 싫어졌다. 때마침 21세기는 캐쥬얼이 정장을 앞지르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직장에서도 캐쥬얼 복장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수트를 입으면 나이들어 보인다는 새로운 나만의 공식을 정립한 이후로 10년 넘게 집착했던 수트 사랑은 잠시 접기로 했다.

그리고 쇼호스트가 되고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나에게 수트는 그야말로 행사 때나 입는 옷이 되고 말았다. 수트를 쇼핑하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한동안 수트를 멀리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수트가 눈에 들어온다. 클래식이 회귀하고 있다는 패션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수트를 입었을 때 노련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는 나이 듦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라는 걸 발견한 것이다. 스무 살에는 빨리 미성숙한 티를 벗고 어른이 되고 싶어 수트를 입었고 나이 마흔이 되면서부터는 너무 어른스럽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싫어 수트를 벗었다. 그런데 다시 수트에 손이 간다. 이제는 어른스러워 보이기 때문도 아니고 포스가 있어 보여서도 아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문득 수트를 입는 것이 이제는 화려한 치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강 아무렇게나 입은 것도 아닌 기본을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젠 어떤 장소나 모임에 가게 될 때 나는 자연스럽게 수트를 다시 꺼내게 됐다.

이제 나에게 수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이 아니다. 언젠가부터 기본을 잃고 요란하게 신경 쓴 멋내기로 나를 가꿨던 옷입기가 화려하지만 촌스럽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걸 알게 된 후 모처럼 아주 심플하고 약간은 심심한듯한 아르마니 수트를 입고 나간 날, 앞에 앉은 손님이 이렇게 말했다. “참 멋쟁이십니다.!”
그때 나의 귀를 의심했다. 나는 더 많이 보태서 멋을 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소홀하지도 않았지만 멋쟁이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그날 미팅을 마치고 나오면서 화장실에 들러 거울 속의 나를 봤다. 내가 어디가 멋쟁이일까? 그때 알았다. 베이직한 실루엣의 아르마니 수트를 입고 나간 그날 나의 말과 행동도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딱 아르마니 수트만큼 적당히 심플했음을……. 누군가 옷은 곧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옷을 골라 입는 것은 곧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뜻하지 않게 아르마니 수트를 차려입고 칭찬을 들었던 그날 이후 곰곰이 옷에 대해서 수트에 대해서 그리고 아르마니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기본’이었다. 결국은 그게 나의 옷을 고르는 취향이나 일하는 방식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발견했다.

수많은 스타일이 유행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는 패션에서 베이직한 전통을 지켜가면서 트렌드를 트렌드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기본! 내가 아르마니 수트를 좋아하는 것은 일을 하는 방식이건 옷을 입는 방법이건 항상 기본을 잃지 않으려 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옷은 곧 그 사람이다.
유난희
명품 전문 쇼호스트, 저서 <여자가 사랑하는 명품>, <명품 골라주는 여자>, <아름다운 독종이 프로로 성공한다>
http://twitter.com/yoonan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