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츠앤컬쳐]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150주년과 ‘세계 적십자의 날’(매년 5월 8일)을 기념해, 한국미술계를 대표하는 화가 150인의 작품이미지 300여 점을 재능기부받아 <생명사랑 희망벽화>를 본사 도로변 옹벽에 설치했다. 본란은 희망벽화를 기획한 한국미술경영연구소 김윤섭 소장이 참여 작가 중 일부를 소개하는 코너이다. <편집자 주>
백영수 화백의 그림에는 ‘가족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집안에서 편하게 만나는 갖가지 기물들, 엄마와 아이 그리고 새집이나 새 등 마치 일상의 작은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수필집 같다. 이렇듯 서정적인 감성을 전해주는 백영수 화백 그림에서 가족은 아주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90세가 넘은 노(老) 화백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반평생을 프랑스 파리에서 지냈다. 화가라면 누구나 동경했던 파리였지만, 고향이나 가족을 떠나 있다는 것은 심적으로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스스로 고백하듯, 평화롭게 잠든 아이를 안거나 업고 있는 어머니의 미소를 통해 말하려는 것은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이다.
백영수 화백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한국 근현대 미술의 전설’ 혹은 ‘신사실파(新寫實派)의 유일한 생존작가’이다. 신사실파는 1947년 출범한 ‘한국 최초의 순수화가동인’으로서 이중섭, 김환기, 장욱진, 유영국 등이 활동한 그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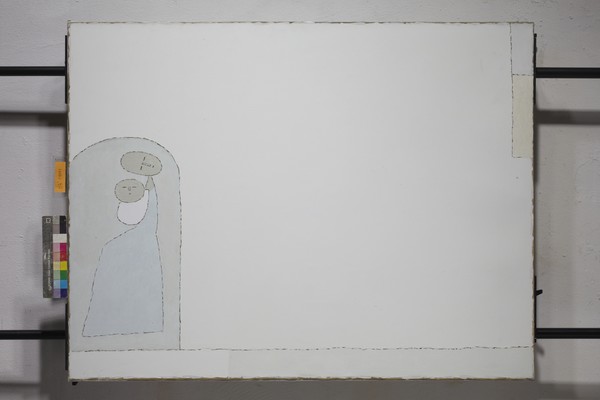
‘새로운 사실화’를 표방하면서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든 신사실파 구성원 중에 막내였던 백영수 화백만이 지금 유일하게 생존해 있다. 그래서 백화백을 ‘한국 근현대미술을 관통하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백영수 화백의 그림을 살펴보면 몇 가지 패턴이 있다. 가장 많이 만나는 예는 천진무구한 천사의 표정을 한 아이와 마치 성모마리아와 같은 온화함으로 그 아이를 업고 있는 어머니의 도상이다. 또한, 그 인물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 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원래 인체는 너무나 다양한 표정을 지니고 있지만, 백 화백의 인물은 최소한의 형태만 갖췄다. 손발마저 생략된 경우도 많다. 얼굴과 몸체만을 강조한 극단적인 요약이자 함축이다. 순수미를 넘어 절제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인물과 함께 등장하는 주변의 환경요소도 마찬가지다. 가령 집안의 기물이나 야외의 나무와 새, 꽃 등의 자연풍경까지 가장 본질적인 묘사만 있을 뿐 필요 이상의 군더더기는 허락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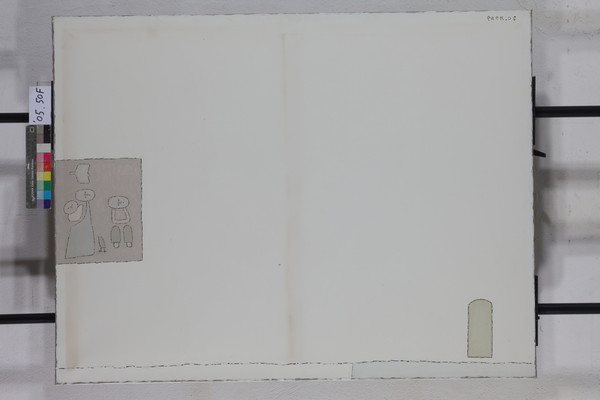
최근 들어 백영수 화백의 그림은 여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작은 창문이 몇 개 등장하는 화면은 어디가 벽면이고, 어디까지 여백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처럼 특유의 공간구성과 특유의 백색 톤의 화면은 ‘지적인 아름다움’과 ‘명상적인 정신성’을 동시에 선사한다. 마치 우리에게 ‘창문 너머의 세상’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곳엔 형용하기 어려운 무한한 사랑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는 듯하다. 바로 아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의 실천은 백영수 화백의 그림에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셈이다.
백영수 화백
1922년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해 2세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이 살던 일본 오사카로 건너감. 오사카 미술학교 졸업. 20대 초반 귀국해 목포의 미술교사와 광주의 대학교수를 거쳐, 40여 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체류하다 2011년 귀국해 의정부 작업실에 자리 잡음.
개인전 : 서울, 로마, 밀라노, 파리, 뉴욕 등 다수.
단체전 : 그림이 있는 파리전(프랑스), 신사실파 60주년 전 외 다수.
작품소장 : 국립 현대미술관 외 다수.
글 | 김윤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