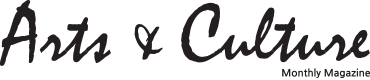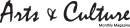[아츠앤컬쳐] 가장 좋아하는 섬을 고르라면 사모아, 피지, 태즈매니아, 발리... 저마다 인생의 한 부분을나눈 섬들이라 내 살과 피처럼 소중해 한참을 망설이게 된다. 완벽한 섬을 고르라면 답하기 쉽다. 단연 모리셔스다. 흠잡을 곳 없는 채색 옷을 입은 야곱의 아들 요셉 같다. 성경에서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완벽한 아들이었고, 그가 입은 채색 옷은 훗날 이집트에서 다양한 민족을 품고 다스리는 왕의 상징이 되었다.
모리셔스를 완벽하다 부르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때문만은 아니다. 이 섬이 가진 진정한 매력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힘이다. 인도·아프리카·중국·프랑스계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의 옷을 입고 모든 민족을 조화롭게 품어 안는다. 큰 바다가 모든 강을 받아들이며 유유히 흘러가듯, 모리셔스가 오랫동안 잔잔히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러니를 품은 섬
인도양 한복판에 자리한 모리셔스는 산맥이 바다를 가르며 솟아오르고, 노예들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새겨진 유네스코유산이 숨쉬며, 달콤한 설탕과 향기로운 차가 일상을 채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슬픔과 애환이 스며든 섬이다. 완벽하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 섬이 진정 완벽한 이유는 노예제와 식민지배라는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나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일구어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지수 19위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되었고,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경제적 안정도 이루어냈다. 자연의 기운과 인간들의 욕망, 희생과 승화의 이야기가 뒤엉켜 묘한 중독성을 품은 섬이다.

깊은 슬픔이 담긴 르몽산
모리셔스는 화산 활동으로 빚어진 섬이다. 남서부에 우뚝 선 르몽산(Le Morne Brabant)은 556미터 높이로 바다를 내려다보며, 주변 라군에서 피어나는 모래 언덕이 수중 폭포처럼 보인다. 이 현상은 해저 퇴적물이 일으키는 착시로, 섬 남쪽에서 보트로 다가가면 에메랄드 바다가 층층이 흘러내리는 듯하다. 이런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르몽산의 의미는 아이러니하게도 ‘비통함’, ‘깊은 애도’다. 이 산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북부의 검은 강 협곡(Black River Gorges)은 울창한 숲과 폭포가 어우러진 협곡으로, 하이킹하며 야생동물을 마주친다.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절 설탕 농장 노동력으로 대거 유입된 인도계가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모리셔스의 제1종교는 힌두교다. 중앙 고원에 자리한 그랑 바생(Grand Bassin)은 힌두교 성지로 자리잡아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는다.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일대를 흐르는 강은 ‘작은 갠지스’라 불리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의 역사가 시작된 섬
유네스코 세계유산 두 곳이 모리셔스의 역사를 밝힌다. 아프라바시 가트(Aapravasi Ghat)는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1849년부터 1923년까지 약 50만 명의 인도 계약 노동자들이 모리셔스를 거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머물렀던 이민자 수용소 유적지다.
1833년 영국이 노예제를 폐지한 후 설탕 농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에서 5년 계약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가 시작됐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었지만 실제로는 계약 기간 동안 농장을 떠날 수 없었고, 임금도 극히 적어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조건에서 일했다. 아프라바시 가트는 바로 이런 ‘계약 노동자(IndenturedLaborer)’제도의 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자유 노동이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노예제를 대체한 또 다른 강제노동 시스템이 이곳에서 시작됐으며, 전 세계 계약 노동자 이주 역사의 첫 장을 연 곳이기도 하다. 지금 모리셔스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인도계 주민들이 바로 이 유적지를 통해 들어온 이들의 후손이다.
르몽산 문화 경관(Le Morne Cultural Landscape)은 도망친 노예들이 숨던 산악지대로, 18세기 말부터 마론(Maroon)이라 불린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저항했다. 절벽 끝에서 바다로 몸을 던진 노예들의 전설이 서려 있는 이 산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웅변한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인도양은 그들의 용기를 되새긴다. 이 유산들은 모리셔스가 다문화의 용광로임을 증언한다.

달콤쌉싸래한 모리셔스의 맛
모리셔스의 특산물은 섬의 풍요를 맛으로 전한다. 보아셰리 차(Bois Chéri Tea)는 남부 고원에서 자란 잎으로 우려낸 향긋한 홍차로, 현지박물관에서 직접 따고 볶는 과정을 배운다. 차 한 모금에 열대 오후의 햇살과 바람이 스며든다. 바닐라 빈(Vanilla Pods)은 열대 기후에서 피어난 자연 향신료로, 디저트에 곁들이면 크림 같은 깊이가 더해진다. 사탕수수에서 증류한 럼(Rum)은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술로, 현지 칵테일에 섞어 마시면 열대 밤을 연상시킨다.
빈도(Vindaye)와 같은 카레 요리는 인도계 주민들이 현지 해산물과 향신료로 만든 독특한 퓨전 음식이며, 파라타(Farata)는 얇게 구운 밀가루 빵으로 각종 카레와 곁들여 먹는다. 이 맛들은 모리셔스가 단순한 풍경이 아닌, 감각을 깨우는 섬임을 보여준다.
‘인도양의 진주’라는 뻔하지 않은 수식어
모리셔스는 몰라서 놓쳤던 보석이다. 이 섬의 진정한 완벽함은 아름다운 지형이나 맛있는 특산물에만 있지 않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이자, 독립 이래 항상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라는 점에서 더욱 빛난다.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가 ‘모리셔스의 기적(Mauritius Miracle)’이라고 부를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1인당 GDP 1만2000달러로 아프리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노예제의 상처와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인도계, 아프리카계, 중국계, 프랑스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야말로 모리셔스가 완벽한 섬이라 불리는 진짜 이유다.
이 섬을 한 번 품에 안으면, 평생 그리움으로 남는다. 이미 4번을 다녀왔지만, 지금도 아련한 섬이다.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는 이유를 이제야 깨닫는다. 완벽함이란 결국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피어날 때 주어지는 훈장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박재아는 ‘섬 좋아서 섬 일하는’ 섬 전문가(Islandophile)로, 지난 20여 년간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 사모아 관광청 및 21개의 태평양 도서국 및 자치령을 관할하는 태평양 관광기구(SPTO), 그리고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MoTCE-RI) 한국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모리셔스, 팔라우, 크로아티아관광청의 파트너이자, 조선대학교 대외협력교수, 태평양학회 이사직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