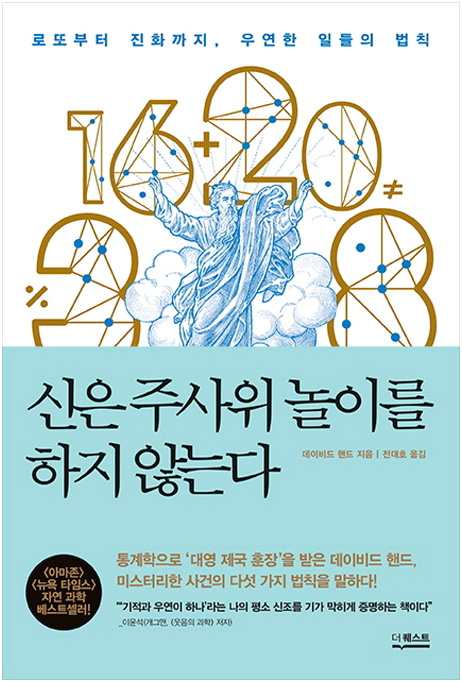
[아츠앤컬쳐] 이 책은 ‘거의 0인 것’과 ‘정확히 0인 것’의 다름에 대한 이야기이자 ‘우연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우연의 또 다른 이름은 허망함이 아니라 소중함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같은 사람이 일생에 번개를 몇 번 맞는다든가, 로또에 수 차례 당첨된다든가 하는 등의 발생 확률이 지극히 낮은 사건들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는 우리가 예상 밖의 일을 예상해야 함을 알려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자면, 우선 실재하는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패턴과 그렇지 않은 패턴을 구분하는 능력을 들 수 있다. 사실 과학은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일 따름이다. 또 ‘출판편향publication bias’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과학저널의 편집자가 부정적 결과를 보고하는 논문보다 긍적적 결과를 보고하는 논문을 출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매우 현실적인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신을 언급하는 설명은 무엇이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다. 설명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한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연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우주에서 살고 있지만, 우연은 고유한 법칙들을 따른다. 그리고 이 법칙들은 확률론의 토대를 이룬다. 우선, 무슨 일인가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필연성의 법칙’부터 살펴보자.
만일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 마치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면 되듯이…. 이걸 많은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패턴이라도 나타나리라고 예상할 만하다는 뜻에서 ‘아주 큰 수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소위 ‘성서암호’도 이 부류에 속한다.
또 우리가 만일 사후에 데이터를 선택한다면 확률을 원래와 전혀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 이를 ‘사후설명편향hindsight bias’이라고 하는데, 화살을 과녁을 향해 쏜 다음에 명중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화살이 떨어진 지점에 과녁을 그려넣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사전에는 수많은 조각들과 잠재적 사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조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는 조각을 맞출 수 있는 방식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예지몽’은 또 어떠한가? 사람들은 보통 하룻밤에 적어도 4~6회의 꿈을 꾸며 그 대부분을 망각한다. 뇌는 별개의 사건들을 연결하고 접합하기 때문에, 어젯밤에 꾼 꿈이 오늘 일어난 특정 사건의 전조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연히 일치하는 꿈과 사건을 주목하면서 나머지는 망각한다. 같은 맥락으로, 오직 난파를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만이 자기네가 신 앞에 신앙을 고백했다고 증언할 수 있다. 고백하고도 빠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증언을 한다는 말인가?
로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벌 수 있는가이다. 특정번호가 당첨될 확률은 변함이 없지만, 자신이 그 번호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당첨권의 액수는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년월일로 구성된 숫자를 선택한다면 당첨자가 몇 명이라도 나올 수 있다. 결국 당첨되었을 때 당첨금이 높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번호를 선택하라는 의미다.
저자는 이 외에도 몇 가지 ‘우연의 법칙’을 더 제시하고 있으나, 결론을 요약하자면 “개연성이 극도로 낮다고 생각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다. 이때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면 낮은 줄 알았던 사건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글 | 최병두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30대 젊은 나이에 체이스맨해턴은행과 한화증권 국제부 그리고 코오롱그룹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으며 지금은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며 아츠앤컬쳐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