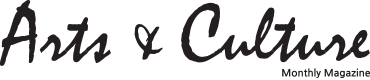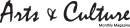[아츠앤컬쳐] “이건 내가 사는 집 전화번호고… 그리고 이건 엄마, 아빠 집 번호… 아빠 회사 팩스번호도 있는데 그것도 적어줄까?”
어쩌면 영영 못 볼지도 모를 이별의 순간, 남자친구가 연락처를 달라는 말에 엠마(앤 해서웨이)는 가방 속에서 급하게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를 적는다. 자기 집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부모님 집 번호에 아빠 회사 팩스번호까지 적어주겠다는 말로 남자친구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애정을 대신 표현한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20년 동안 지켜보기만 하고 어긋나는 사랑이야기를 다룬 영화 <ONE DAY>에서의 마지막 장면이다. 아빠회사 팩스번호까지 적어주겠다는 앤 해서웨이의 애절하면서도 쑥스러워하는 표정이 어찌나 귀엽던지 풉!하고 웃으면서도 나의 눈길은 그녀가 전화번호를 적어 부욱 찢어 건네는 와인커버지의 수첩에 눈길이 갔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 1988년도 배경, 그때는 그랬다. 마음에 드는 여학생에게 커피 한잔하자는 쪽지를 건넬 때, 소개팅에 나온 상대가 마음에 들어 집 전화번호를 적어 줄 때, 친구를 기다리다 지쳐 커피숍을 나오며 혹시 늦게라도 올지 모를 친구에게 ‘기다리다 간다’는 쪽지를 남길 때 우리는 수첩 속지 한 장을 찢어내 마음을 전했다. 비가 내려 센티해진 날에는 감상에 젖어 그럴싸한 시를 써놓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수첩이 전화번호부며 스케줄러고 메모지면서 일기장이고 때론 러브레터였다.
스케줄뿐만 아니라 친구와 애인, 가족들의 중요한 기념일을 적어놓고 소소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꿈도 기록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연인과 헤어진 후 가슴 아파 흘린 눈물까지 수첩은 모두 기억했다. 아날로그 시절, 수첩은 한 사람의 모노드라마고 그 사람의 전부인 일생이기도 했다.
나에게 수첩은 더 특별한 의미다. 계획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는 메모할 수첩이 없으면 불안하다. 나의 수첩에는 현재보다 미래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이 담겨 있다. 쓸 내용이 없어도 수첩은 항상 가방 속에 있어야 하고 출장을 갈 때도 동행한다. 중요한 스케줄부터 차를 타고 가다 커피를 마시다가 낯선 이방지에서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어야 할 때 수첩은 항상 내 옆에 있다. 방송하면서 사용할 멘트들이 불쑥불쑥 생각나면 그 멘트들을 적어놓는 커닝 페이퍼기도 하다. 하루를 점검하고 1주일을 내다보며 한 달 뒤를 계획하고 1년 뒤를 설계하는 내 미래를 담는 꿈의 다이어리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디지털 세상이라 해도 수첩만큼은 버리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난 후부터는 수첩은 나에게 스케줄러보다는 메모장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억해야 할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메모하면서 계획하고, 계획하면서 일사불란했던 머릿속 생각이 정리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획하는 내 습관의 동반자가 몰스킨(Moleskine)이다. 처음 몰스킨을 알게 된 건 파리 콜레트(collette) 편집매장이었다. 스타일리쉬한 젊은 남자가 콜레트 매장 음반코너에서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핫해 보일 수 없었다. 아이폰에 터치할 것만 같은 세련된 남자가 펜으로 수첩에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은 진정한 보보스족(BOBOS)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 모습을 따라 하고 싶어 콜레트 매장에서 몰스킨 수첩 하나를 사 들고 나왔다. 손바닥만 한 메모용 수첩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싸 ‘정말 비싸다’를 연발하면서 구입했지만 손에 닿는 소프트커버의 감촉이며 속지 필기감이 좋아 아주 만족하고 마니아가 되어 버렸다.
몰스킨은 나에게 과거고 현재이며 미래를 담고 있는 나의 바이오그래피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분 좋은 일이 많기를 꿈꾸면서 새해를 맞아 또 한 권의 몰스킨을 장만했다.
기록하는 삶은 아름답고 계획하는 삶은 실수하지 않기에! 몰스킨(Moleskine)은 약 200년 전 프랑스 파리의 작은 문구점에서 처음 선보였다. 빈센트 반 고흐와 파블로 피카소,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 당시 예술가와 작가 그리고 사상가들이 즐겨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몰스킨은 한때 브랜드의 경영난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지만 1997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작은 출판사가 복원한 이래 과거 명성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예전의 양피가죽으로 빈티지한 멋을 풍기던 느낌은 실용적으로 인조가죽으로 대체되면서 사라졌지만 깔끔하다 못해 밋밋하기까지 한 몰스킨을 펼치면 하얀 종이에 내 꿈의 첫 점을 찍는 설렘은 예전 감동 그대로다. 아무리 디지털 세상이라고 해도 아날로그인 몰스킨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유난희
명품 전문 쇼호스트, 저서 <명품 골라주는 여자> <아름다운 독종이 프로로 성공한다>